일자별 세션
프로그램 세션을 자세히 알려드려요.

전북대학교
사회학과 교수

계명대학교
사회학과 교수

GIST
인문사회과학부 교수

국민대학교
교양학부 교수

GIST
인문사회과학부 교수

KAIST
수리과학과 교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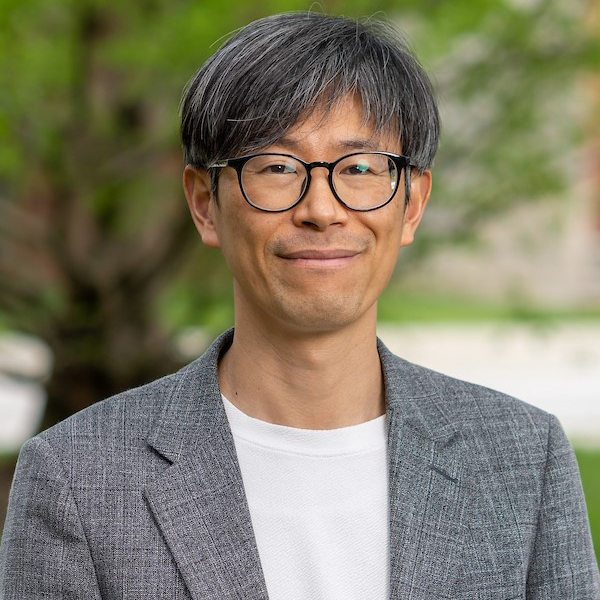
전남대학교
영어영문학과 교수

미국 켄트주립대학교
평화갈등학과 교수

| 이름 | 토비 월시 |
|---|---|
| 소속 | 호주 뉴사우스웨일스대학교(UNSW) |
| 직함 | 인공지능 석학 교수 |
| 약력 | 토비 월시는 세계적인 인공지능(AI) 연구자이자 저술가로, AI 기술이 인간 사회에 미치는 영향과 미래를 연구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 그는 호주 뉴사우스웨일스대학교(UNSW)의 인공지능 석좌교수로 재직 중이며, 호주 정부 산하 데이터 과학 연구기관인 CSIRO Data61의 교수이자, 퀸즐랜드공과대학교(QUT)에서 겸임교수로 활동하고 있다.그는 인공지능(AI)이 우리 삶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활용되도록 제한과 규제를 강력히 주장하며, 유엔(UN), 각국 정상, 의회, 기업 이사회 등 다양한 국내외 주요 기관에서 AI 윤리 및 정책에 대해 강연과 자문을 제공하고 있다. 호주 디지털 혁명의 ‘록스타’로 불리며 AI 연구뿐만 아니라 AI가 사회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목소리로도 널리 알려져 있다. 특히 자율 살상 무기(킬러 로봇) 문제에 대해 국제사회에서 앞장서 반대하며, 책임 있는 AI 개발과 윤리적 활용을 촉구하고 있다.토비 월시는 뉴욕타임스(New York Times)에 소개되는 등 주요 언론에 자주 등장하며, TV와 라디오 방송에서 AI 최신 동향을 대중에게 전달하고 있다. 그의 트위터 계정은 AI 분야에서 팔로우할 만한 상위 10위 계정으로 선정되기도 하였다. |
기술은 사회를 형성하지만, 사회 또한 기술을 형성할 수 있다. 우리는 사회를 더 나은 방향으로 이끌고, 분열로 향하는 힘에 맞서기 위한 여러 지렛대를 작동 시킬 수 있다. 오늘날 사회를 형성하기 시작한 가장 큰 기술적 힘은 아마도 인공지능(AI)일 것이다. 그 변화의 규모와 속도는 전례가 없다. 매일 10억 달러 이상이 AI에 투자되고 있다. 그러나 AI가 가져오는 엄청난 가능성과 함께 상당한 위험도 존재한다. 이러한 위험 중 일부는 이미 뚜렷이 드러나고 있다. 정치적 토론과 언론의 자유를 시험에 들게 하는 허위 정보와 잘못된 정보, 전장을 변화 시키고 있는 자율 무기, 그리고 사람들의 생계를 빼앗아가는 로봇 등 세 가지 사례만 봐도 그렇다. AI는 어떻게 사회를 형성할 것이며, 사회는 AI를 어떻게 형성해야 할까요? 이 과정에서 인간의 기본권과 민주주의의 핵심이 걸려 있다. 40년 동안 AI를 연구해 온 토비 월시 교수는 AI의 부상으로 우리가 직면하게 될 가장 큰 도전과, 이에 대응하기 위해 필요한 여러 가지 수단에 대해 설명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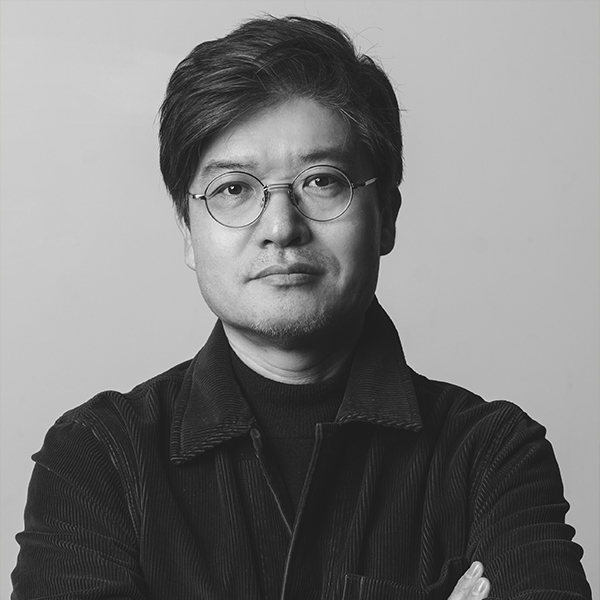
| 이름 | 이광석 |
|---|---|
| 소속 | 서울과학기술대 |
| 직함 | 교수 |
| 약력 | 이광석은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교수이며, 비판적 문화이론 저널 《문화/과학》의 편집인으로 일한다. 주요 연구 분야는 기술비판이론, 커먼즈, 플랫폼 연구, 기술 생태학, 인공지능 자동화와 노동 등에 걸쳐 있다. 지은 책으로는 《디지털 폭식 사회》, 《피지털 커먼즈》, 《포스트디지털》, 《디지털의배신》, 《데이터 사회 미학》, 《데이터 사회 비판》 등이 있다. 직접 기획하고 엮은 책으로 《AI, 플랫폼, 노동의 미래》, 《불순한 테크놀로지》, 《현대 기술·미디어 철학의 갈래들》, 《사물에 수작부리기》 등이 있고, 그 외 다수의 국내외 학술 논문과 평론이 있다. |

| 이름 | 김회수 |
|---|---|
| 소속 | 전남대학교 |
| 직함 | 명예교수/철학박사 |
| 약력 | -전남대학교 사범대학 교육학과 명예교수(현재) -전남대학교 사범대학 교육학과 교수(역임) -전남대학교 사범대학 학장(역임) -한국교육정보미디어학회 회장(역임) -한국교육정보미디어학회 고문(현재) -한국교육공학회 이사(현재) -교 육부 정책자문위원(역임) -노무현대통령자문 교육혁신위원회 위원(역임) -전국 국립사범대학학장협의회 회장(역임) |

| 이름 | 박형주 |
|---|---|
| 소속 | 아주대학교 |
| 직함 | 석좌교수 |
| 이메일 | alanpark@ajou.ac.kr |
| 약력 | 박형주 교수는 서울대 물리학과 졸업 후 미국 U.C. 버클리에서 수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 고등과학원과 포항공대에서 교수를 지냈고, 국가수리과학연구소장을 거쳐 아주대 16대 총장을 지냈으며, 현재 아주대 수학과 석좌교수이다. 2014년 세계수학자대회 조직위원장과 국제수학연맹 집행위원을 지내며 인공지능 시대의 글로벌 교육 환경 변화에 대한 논의에 참여해왔고, 교육부의 2022 국가교육과정 개정추진위원장을 지냈다. 주요 강의 및 저서로는 "배우고 생각하고 연결하고"와 "내가 사랑한 수학자들" 등이 있다. |
거대 데이터와 인공지능의 활용이 일상화되면서, 지식 전수 중심의 전통적 교육 패러다임은 심각한 도전에 직면해있다. 새로운 정보와 지식의 창출 속도가 가속화 되면서 학교에서 배우는 지식의 유효기간은 점점 짧아지고 있고, Chat GPT가 들어온 교실에서 이전의 평가 방식은 더이상 유효하지 않다.
학교는 학생의 지적 성장과 미래 준비가 가능한 곳이어야 한다. 빈번한 커리어 변화와 새로운 지식의 끊임없는 학습이 대세가 되면서, ‘필요할 때 학습할 수 있는 능력’과 ‘문제 해결 능력’은 미래 교육의 중심 목표가 되어야 한다.‘많이 아는 인재’ 보다 ‘문제해결 능력을 갖춘 인재’를 기르기 위해 지금 우리는 무엇을 어떻게 바꾸어야 할까. 직원 채용에서 대학 졸업장을 요구하지 않는 글로벌 기업들이 늘고 있다. 온라인 학교(MOOC) 같은 대학의 대체재는 급속도로 커가고 있다. 그러니 예전의 뻔한 교육을 받으러 학생들이 대학에 가야 할 이유는 사라지는 중이다. 그래서 2018년 미국 대학의 30%만 정원을 채웠다. 대학의 소멸 가능성은 발등의 불이 됐다. 담과 건물이 있는 전통적인 학교가 온라인만 있는 학교들에 비해 더 잘하는 게 뭔지를 고민하고, 이를 중심으로 빠르게 변화해야 한다. 지식전달 중심의 온라인 학습과 토론 및 문제풀이 중심의 오프라인 학습을 최적으로 혼합한 블렌디드 러닝의 구현은 이제 피할 수 없는 흐름이 됐고, 교육에서 프로젝트의 활용도 늘어날 수 밖에 없다. 이러한 변화를 통해서 소통 능력과 문제해결 능력을 기르는 것이 변화의 방향이 되어야 한다.

| 이름 | 김홍기 |
|---|---|
| 소속 | 서울대학교 |
| 직함 | 서울대학교 치의학대학원 교수 한국교육정보화재단 이사장 빅데이터 혁신융합대학 사업단장 |
| 이메일 | hgkim@snu.ac.kr |
| 약력 | 김홍기 교수는 서울대학교 치의학대학원 교수이자 한국교육정보화재단(KREN) 이사장, 그리고 빅데이터 혁신융합대학(COSS) 사업단장으로 활동하며 교육, 의료, 정보기술의 융합을 선도해온 학자입니다. AI, 온톨로지, 학습 분석에 기반한 실천적 연구를 통해 국내외 학술 및 정책 현장에서 학습자 중심의 데이터 기반 교육 혁신을 실현하고 있으며, 교육 생태계의 전환 방향을 제시하는 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지속 가능한 학습 환경 구축과 디지털 포용 실현에도 깊은 관심을 가지고 다양한 융합 프로젝트를 이끌고 있습니다. |
2025 광주국제인문위크의 주제인 민주, 인권, 평화는 오늘날 교육이 추구해야 할 핵심 가치이자, 인공지능(AI)과 데이터 기술의 확산 속에서 다시금 깊이 있게 사유되어야 할 인류 보편의 철학적 기반입니다. 기술 중심의 전환이 교육 전반을 빠르게 재구성하고 있는 지금, 우리는 교육의 기능과 목적을 단순한 디지털화의 차원을 넘어 ‘인간 중심의 학습 생태계’로 확장해 나가야 합니다.
본 발표는 서울대학교 김홍기 교수가 주도하는 빅데이터 혁신융합대학 사업단과, AI 기반의 진화형 학습 플랫폼 Evolvable Learning Platform(ELP)의 실천적 모델을 중심으로, 교육의 구조적 혁신과 학습 경험의 재구성을 논의합니다. ELP는 심리-언어 기반의 온톨로지 프로파일링, P3BL(Prompt-, Project-, Problem-based Learning) 패러다임, 그리고 멀티 에이전트 LLM 아키텍처를 통해, 학습자 맞춤형 인공지능 학습 시스템의 새로운 방향을 제시합니다. 이 플랫폼이 지향하는 네 가지 학습 생태계—▲연결된 학습(Connected Learning) ▲보편적 접근성(Universal Accessibility) ▲경계 없는 학습(Seamless Learning) ▲공동체 기반 학습(Learning for Community)—은 AI가 단지 도구를 넘어, 민주성과 포용성을 실현하는 교육 인프라로 기능할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특히 AI 기술의 윤리적 활용, 디지털 격차 해소, 기술 설계의 공공성 확보, 그리고 지속 가능한 평생학습 체계와의 유기적 통합은 이 플랫폼의 철학과 실천에 깊이 내재된 핵심 원칙이기도 합니다.
광주는 한국 민주주의의 상징이자, 교육과 사회 정의의 의미를 성찰하기에 가장 적합한 장소입니다. 이 발표는 기술과 인문학의 접점을 탐색함으로써, AI 시대 교육의 공공성과 사회적 책임에 대한 통합적 비전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 이름 | 유희석 |
|---|---|
| 소속 | 전남대학교 영어교육과 |
| 직함 | 교수 |
| 이메일 | yoohuisok@yahoo.com |
| 약력 | 솔트레이크 시티 소재 유타대학 영문과 방문교수 (2011-2012, 2016, 2019) 블루밍튼 소재 인디애너 주립대학 영문과 박사후과정 (2001-2003) 서울대학교 영문과 박사 (2001) 박사 논문: The Portrait of a Lady와 Adventures of Huckleberry Finn 비교연구: 19세기 국민문학 전통의 계승을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영문과 석사 (1989) 석사 논문: 로버트 로월의 고백시와 그 역사적 의미 한국외국어대학교 영어과 학사 (1983-1987) |
"Education, I fear, is learning to see one thing by going blind to another" Aldo Leopold, A Sand County Almanac (Penguin, 2020), 119.
일찍이 하이데거는 오늘날 철학의 자리를 대신한 것이 인공두뇌학(Kynernetik)이라고 말한 바 있다. 1966년에『슈피겔지』와의 인터뷰에서 발언한 것이고 이곳저곳에서‘인공두뇌학’에 대해 언급했다. 이듬해 한 강연에서는“과학의 세계는 인공지능적 세계가 된다“고 진단하면서 예술의 기원을 다시금 성찰한 바 있다. 튜링의 기념비적 논문「컴퓨터 기계와 지능」(Computing Machinery and Intelligence)이 발표된 것이 1950년이었으니. 하이데거가 그의 논문들을 직접 읽었을 가능성도 없지 않다. 그는 인과율을 논하면서 이렇게 말하기도 한다. "오늘날 우리에게서는 더 이상 아무 것도 생성되지 않고 있다. 왜 그런가? 왜냐하면 우리를 자극하고 촉진하는 전승(傳承)에 대해서 사유하려는 가능성은 상실되고, 그 대신에 우리의 언어는 전기로 작동되는 생각하는 기계와 계산하는 기계에 내맡겨지고 있기 때문이다. 더 나아가 근대 기술과 과학은 완전히 새로운 사유방식과 예측할 수 없는 결과로 우리를 이끌고 있으며, 성찰하는 사유를 없어도 되는 불필요한 것으로 몰아붙이기도 있다.
이같은 몰아붙임의 시대에서 인공지능의 도전을 어떻게 사유해야 하는가는 그 자체로 숙고해야 할 비판적 인문학의 절체절명의 과제이다. 인공지능은 결코 철학을 이길 수가 없다고 호언하는 것이나“‘지속가능한 기술의 성장’및‘인간의 얼굴을 한 기술’을 위해서 인공지능에 대한 ”윤리적인 비판과 성찰“을 요청하는 것은 (감히 말하건대) 우리가 아직도 사유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는 표징인지도 모른다. 하이데거의 발상을 빌리면 인공두뇌학이 번성함으로써 모든 것이‘황무지’로 화하는 세계에서조차 구원의 힘이 어김없이 자라난다면 말이다. 그러한 힘을 자기 안에 맞아들이기 위해서라도 인공지능에 대한 근원적 사유가 절실하다. 대학지식인에게 그러한 사유가 이뤄질 수 있는 본질적 토양을 고등고육의 현장에서 찾아내고 비옥하게 만들 책무가 새로이 주어진 것이다.

| 이름 | 강민형 |
|---|---|
| 소속 | 전북대학교 |
| 직함 | 조교수 (사회학) |
| 이메일 | minhyoungkang@gmail.com |
| 약력 | 존스홉킨스대학교 박사(사회학) 연세대학교 박사후연구원 한국노동연구원 부연구위원 전북대학교 사회학과 조교수 |

| 이름 | 임운택 |
|---|---|
| 소속 | 계명대학교 |
| 직함 | 교수 |
| 이메일 | wtlim@kmu.ac.kr |
| 약력 | 한국사회학회장 (2025- ) 경북지방노동위원회 공익위원 (2014.11.- ) 이론사회학회 회장 (2022년) 비판사회학회 회장 역임 (2023-2024년) 대통령직속 정책기획위원회 국민성장분과 부위원장(2020.3-2022.2.) 국무총리산하 경제인문사회연구회 기획평가위원 (2019-2022) |
인공지능(AI)은 21세기 핵심 기술로, 사회의 모든 분야와 인간의 일상생활에 광범위한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앞으로도 계속 미칠 것이다. 기술 혁명은 항상 사회적 변혁을 초래할 잠재력을 지니며, 사회 내 권력관계와 지배구조를 근본적으로 변혁시킬 수 있다. 인간, 사회, AI 간의 관계를 살펴보면, 종종 기술에 대한 무비판적인 열광과 디스토피아적인 멸망 환상 사이에서 오가곤 한다. 그러나 AI의 개발과 적용과 관련된 권력 문제는 소홀히 다루어지고 이론적 논의가 부족하다. 이 글은 AI가 사회적 권력관계와 지배구조에 미치는 영향을 다루며, AI의 활용이 경제, 정치, 사회에서의 권력과 지배 관계를 어떻게 변화시키며, 이것이 민주주의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한다. 이 과정에서 AI는 본질적으로 평등화, 평준화, 민주화 효과를 갖지 않는다는 점에 주목한다. 오히려 기존의 권력 및 지배 관계는 강화되고 중앙집중화되며 독점화되고 안정화되는 경향이 두드러진다. 즉, 이미 권력을 가진 주체들의 권력과 지배 권한이 확대되며, 이는 불균형과 불평등의 지속과 심화로 이어질 수 있다.

| 이름 | 장진호 |
|---|---|
| 소속 | 광주과학기술원(GIST) |
| 직함 | 인문사회과학부 교수 |
| 약력 | 2019년 캘리포니아대(버클리) 방문학자 2017-8년 광주과학기술원 기초교육학부 학부장 2006-9년 서울대학교 사회발전연구소 연구원 2006년 일리노이대(UIUC) 사회학 박사 |

| 이름 | 안드레이 란코프 |
|---|---|
| 소속 | 국민대학교 |
| 직함 | 교수 |
| 이메일 | andreilankov@gmail.com |
| 약력 | 1992 러시아 레닌그라드국립대학 조교수 1992-96 중앙대학교, 오산대학 전임강사 1996-2004 호주 호주국립대학 교수 2004- 국민대학교 교수 |
2000-10년대 초까지 인터넷과 휴대폰의 확대는 많은 희망을 불러왔다. 인터넷 덕분에 대의민주주의보다 직접민주주의가 가능하고, 검열 실시가 불가능하고, 권위주의 정권이 민중 앞에 굴복할 것이라고 많이 예측되었다. 그러나 수많은 권위주의 정권이 보여주듯 지난 10-15년 동안 오늘날의 IT기술은 권위주의를 파괴하는 것보다 권위주의를 강화하는 세력이 되어버렸다. 민주 사회에서 IT의 영향이 매우 다양하고 서로 어긋나는 결과를 불러왔지만, 권위주의 국가에서 어디에나 엘리트계층의 통제력과 감시력을 많이 강화했다. 이 전례를 보면 AI의 등장은 대체로 비슷한 결과를 야기할 수 있다고 생각된다. 권위주의 정권은 AI 기술을 이용해서 원래 상상하지도 못했던 감시와 통제 능력, 반체제 경향의 예방 능력을 얻을 것 같다. 흥미롭게도 AI 자체는 문제가 아닐 수 있지만, 반체제 세력을 용인하지 않는 경찰국가에서 AI가 국가의 수단으로만 작용하는데, 이것은 대단히 무서운 수단이다. 얼마 전까지 불가역적으로 생각되었던 세계 민주화의 흐름은 새로운 장애물과 마주하고 있다. 이 장애물은 정권이 독점한 AI능력이다.

| 이름 | 김건우 |
|---|---|
| 소속 | 광주과학기술원 |
| 직함 | 교수 |
| 이메일 | nomosphysis@gist.ac.kr |
| 약력 | 현재 광주과학기술원(GIST) 인문사회과학부 교수로 재직하고 있다. 주된 연구 관심사는 법철학의 다양한 측면과 관련하여 법의 토대를 검토하는 것과, 인공지능과 생명공학 등 첨단 과학기술을 둘러싼 윤리적, 법적, 사회적 문제를 탐색하는 데에 있다. 최근에는 이 두 관심사를 종합하여 이른바 ‘포스트휴먼 혹은 포스트디지털 법리학’이라는 연구 기획을 통해 근대법의 해체와 재구성에 주력하고 있다. 관련 주제로 다수의 논문을 썼으며, 역서로 프레더릭 샤워, 법률가처럼 사고하는 법(도서출판 길, 2019), 편저로 인공지능 규제거버넌스의 현재와 미래, 법, 과학을 만나다(법문사, 2025) 등이 있다. |

| 이름 | 김재경 |
|---|---|
| 소속 | KAIST |
| 직함 | 교수 |
| 이메일 | umichkim@gmail.com |
| 약력 | 의생명 현상을 수학의 언어로 풀어내는 연구자다. 생체시계, 수면, 약물 투여 시점 등 생명과학의 난제를 수학 모델링으로 설명해왔다. 수학자이지만, 국내외 의약학·생명과학 실험실과 긴밀히 협력해왔다. 최근에는 60년간 밝혀지지 않았던 생체시계의 구조를 규명하고, FDA 가이던스에서 사용되던 수식의 오류를 발견해 해결한 바 있다. 또, 항암 치료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최적 투여 시점을 수학적으로 도출해 주목을 받았다. 서울대학교 수학교육과를 졸업하고, 미국 미시간대학교에서 박사학위를 받았다. 수학을 통해 생명의 원리를 밝히는 일에 매료돼 지금까지 연구를 이어오고 있다. 2015년 상산젊은수학자상, 2021년 올해의 최석정상을 수상했으며, 2025년부터는 한국인 최초로 응용수학 최고 권위지 SIAM Review의 에디터로 활동하고 있다. 현재는 기초과학연구원(IBS) 의생명수학그룹을 이끌고 있다. 최근 교양 수학서 『수학이 생명의 언어라면』을 집필하며, 대중과의 접점도 넓히고 있다. 평소 다양한 분야의 사람들과 이야기 나누는 것을 즐기며, 이러한 교류 속에서 새로운 연구 아이디어를 얻는 경우가 많다. 언젠가는 모든 학문 분야의 저널에 논문을 써보는 것이 꿈이다. |
AI는 이미 우리의 일상과 사회 구조를 급속히 변화시키고 있습니다. 하지만 AI의 본질은 복잡한 수학적 사고에 뿌리를 두고 있으며, 앞으로 수학적 지식은 단순한 기술을 넘어 새로운 지식 계급의 기준이 될 수도 있습니다. 본 강연에서는 수면 질환 진단과 정신 건강 예측을 위한 AI+Health 융합 사례를 통해, 어떻게 수학과 인공지능이 의료의 비용을 낮추고, 보다 평등한 건강 관리 시스템을 가능하게 하는지를 소개합니다. 동시에, AI 시대에 민주‧인권‧평화라는 보편적 가치를 지키기 위해 우리가 고민해야 할 인문학적 질문을 던집니다. "수학은 지식 계급을 만들 것인가?" "AI는 인간 존엄성과 평등을 강화할 수 있을까?" AI 기술을 넘어, 인류가 함께 고민해야 할 미래를 함께 모색하고자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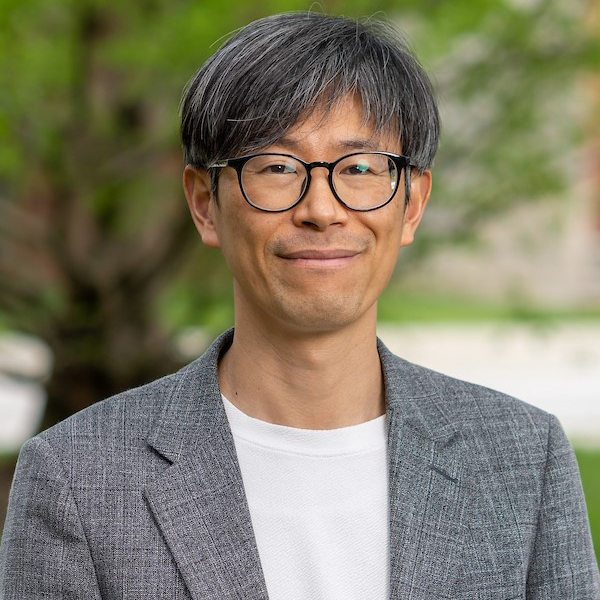
| 이름 | 김연민 |
|---|---|
| 소속 | 전남대학교 |
| 직함 | 영어영문학과 교수 |
| 약력 | 아일랜드 문화/문학, 문화기억, 영국시이다. 현재 아일랜드 공화주의(republicanism)에 관한 연구를 수행중이다. 『광주오월민중항쟁사료전집』에 수록된 구술증언 일부를 발췌하여 영문으로 번역하는 프로젝트를 총괄한 바 있다(2023년)./td> |
AI시대의 수학적 문해력이 미래사회의 의료는 물론 민주, 인권, 평화와 같은 가치의 확장에 기여할 것이라는 김재경 교수님의 발표를 잘 들었습니다. AI에 대한 기대와 우려가 혼재된 오늘날 긴장 상황에서 AI에 대한 보다 균형 잡힌 시선이 필요해 보이는 시기입니다. 먼저, AI가 의료 비용을 낮추고, 의료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을 확장시킬 것이라는 점은 고무적인 현상입니다. 동시에 저는 몸의 터치와 기억의 관점에서 AI의 시대를 고찰하고자 합니다.
리차드 카니(Richard Kearney)는 『터치』(Touch, 2021)에서 코로나 팬데믹이 정점이던 최근 몇 년간 사람들이 터치를 암묵적으로 금기시 해왔음을 지적합니다. 더욱이 #Me Too 운동과 더불어 타인의 몸을 터치하는 행위는 혐오의 대상으로까지 여겨졌습니다. 그러나 카니가 지적하듯이 고대 신화 및 의학 전통, 현대 해석학, 트라우마 연구, 뇌과학에 이르기까지 터치의 중요성은 꾸준히 제기되어 왔습니다. 특히 히포크라테스와 대조되는 아스클레피오스식 의술, 즉 터치를 통해 치유하는 전통은 서양 의학에서 줄곧 주변화되어 왔지만, 최근 디지털로 전환되는 탈육화(excarnation) 시대에서 트라우마 치료와 같은 영역에서 사람과 사람, 사람과 동물 간 직접적 터치의 중요성은 더욱 강조되고 있습니다. 더욱이 잃어버린 터치의 감각이 AI기술의 도움으로 활성화되어 치유를 이끈 사례도 있습니다. 최근 VR과 햅틱 기술이 발전으로 자녀를 잃은 부모가 가상현실에서 자녀와 재회하고 직접 어루만지면서 트라우마가 치유되는 과정을 그린 다큐멘터리는 AI 기술이 (오감의) 몸의 기억을 회복하여 치유로 이끈 대표적인 사례입니다(MBC 다큐멘터리 <너를 만났다>).
AI시대에도 여전히 인류의 보편적인 가치인 민주, 인권, 평화도 터치와 긴밀히 연결됩니다. 시민 개개인으로 인권을 보장받고, 평화로운 민주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살아가는데 있어, AI 기술의 발전은 수평적인 의사소통과 의사결정 구조를 가져올 수 있기에 민주주의를 이루는 훌륭한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동시에 소위 탈진실(Post-truth) 시대에서 가짜 뉴스의 범람과 진실의 왜곡이 AI기술을 통해 확산, 재생산되면서 민주, 인권, 평화의 가치가 위협받고 있는 점도 절대 간과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여기서 터치를 통한 몸의 기억은 AI시대에 새로운 대안공동체를 이룰 수 있는 힌트를 제공해 줍니다. 카니가 말한 공통체(the commons of the body)는 몸으로 연대되는 공동체입니다. 즉, 함께 통하는 몸으로서 공통체는 세계 각지에서 트라우마의 고통을 겪고 있는 이들이 그 몸과 마음의 고통을 공통분모로 국제적 연대를 구축하는 것입니다. “외부의 몸(foregin body)에 의해 상처를 받아 우리는 상실된 몸(nobody)가 되어 새로운 몸(somebody)이 되기 위해서는 다른 몸(another body)과 연결될 필요가 있다. 따라서 트라우마를 겪는 상실된 몸에서 재통합된 새로운 몸으로 옮겨 가는 것은 고통을 겪어 본 모든 몸(everybody)을 향한 공감적인 열림이 된다. 인간의 감각은 궁극적으로 몸을 지닌 감각이다”(『터치』 130). 이 공통체는 대면 접촉을 통해 몸의 아픈 기억들을 공유하면서 치유로 나아갈 수 있는 치유 공동체입니다. 동시에 이 공통체는 단지 물리적 몸의 연결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학살, 내전과 전쟁을 겪은 당사자들 그리고 그들의 다음 세대들이 가상현실에서 폭력의 현장을 감각을 통해 재경험하여 역사적 진실을 대면하고 규명하는 한편, 서로에 대한 용서와 이해, 그리고 화해로 나아가는 상호 치유 공동체입니다.
“인간은 사회적 존재다”라는 아리스토텔레스의 명제는 이제 “인간은 터치하는 존재다”로 재해석될 수 있습니다. 물론 이 터치는 AI 기술을 통해 더욱 확장되기도 조작되기도 할 것입니다. AI 기술에 대한 낭만적인 기대와 회의주의적인 거부 사이의 긴장 속에서 접점을 찾는 것이 바로 우리시대의 과제일 것입니다.

| 이름 | 랜든 핸콕 |
|---|---|
| 소속 | School of Peace & Conflict Studies Kent State University, USA |
| 직함 | Professor and Graduate Coordinator |
| 이메일 | lhancoc2@kent.edu |
| 약력 | Landon E. Hancock is Professor at Kent State University’s School of Peace and Conflict Studies, the living memorial to four students shot and killed by the Ohio National Guard on May 4, 1970. He has received two Fulbright awards and was a Council on Foreign Relations-funded Local Peacebuilding Advisor to the UN Secretary General’s Peacebuilding Fund. He is co-editor (with Christopher Mitchell) of Zones of Peace (2007), Local Peacebuilding and National Peace (2012) and Local Peacebuilding and Legitimacy (2018), and Local Peacebuilding After Peace (2021) with Susan H. Allen, Christopher Mitchell, and Cécile Mouly. His articles have appeared in numerous journals including Peacebuilding, National Identities, Ethnopolitics, Negotiation Journal, Peace & Change, and Conflict Resolution Quarterly. |
Many tout the uses of large language models in helping lift the burden of writing and research off of the shoulders of busy workers, and presumably students. The benefits appear to be many, but few are addressing the costs, the shortfalls that have already begun to appear in this generation’s students, many of whom have grown up using technologies to substitute for critical thinking and many of whom have been conditioned by our economic systems to put the ends before the means. So what if they use Grammerly to write their papers, or Chat GPT to do their research, in the end the grade they receive is the same, and most likely better. However, this approach, much like many of the technological advances made in the last half-century, ignores the costs of shifting the burden of critical thinking off of human shoulders—quite literally—and on to large language models, many of which, arguably, are little more than plagiarism machines, mixing and matching the content created by hardworking humans and producing outputs which ranges from the adequate to the downright wrong and illogical.
So, while the captains of industry press ahead with a technology which promises to reduce costs and increase productivity, the rest of us are left asking questions about the value of AI in education and learning. It seems clear that while many technologies have saved labor, the goal of reducing the amount—and possibly the quality—of thinking labor that humans do has the potential to do more harm than good for society, raising the question of whether increased profits and productivity are sufficient reason to allow AI technologies unfettered access to our youth and students. To paraphrase the Bible, it is worth nothing to teach machines to think if we then fail to teach people to do so.

| 이름 | 홍기빈 |
|---|---|
| 소속 | 글로벌정치경제연구소 |
| 직함 | 소장 |
| 이메일 | tentandavia@naver.com |
| 약력 | 정치경제학자 칼폴라니 사회경제연구소 소장 역임 저서 [융합지성사] (공저) (바다 출판사) [어나더 경제사] 1, 2 (시월) [4차 산업혁명이라는 유령] (휴머니스트) |
인공지능은 순전히 기술과학의 발전으로 갑자기 나타난 것이 아니다. 그 발전을 촉진했던 것은 20세기 이후 기업 및 생산조직 경영에서 나타났던 테일러주의/포드주의가 인간의 정신노동 나아가 과학, 예술, 학문 등의 정신적 활동 전판으로 적용되었던 “장기적 추세”에서 찾아야 한다.
정신활동의 테일러주의/포드주의로의 재편은 정신 활동의 규격화와 전문화/파편화를 낳았고, 이는 다시 종합의 문제 그리고 창의성의 문제를 낳은 바 있다. 이는 정신 활동의 위계화라는 문제, 그리고 혁신 및 창조의 정체라는 문제로 이어지게 되었다.
인공지능은 알고리즘으로 이러한 규격화된 전문적 활동을 대체할 뿐만 아니라 종합과 창의성의 영역에서도 새로운 지평을 열어내었다. 하지만 인공지능이 발휘할 수 있는 종합과 창의성의 능력은 인간의 자연지능의 그것과는 다른 성격의 것이므로, 종합과 창의성에 있어서 인간의 역할이 사라진 것은 아니다.
인공지능과 자연지능을 결합시켜서 새로운 차원의 종합과 창의성을 발휘할 수 있는 인간 지성의 시대가 가능하다. 하지만 이를 위해서는 지난 1백년 동안 대학과 사회를 지배했던 정신활동의 테일러주의/포드주의화의 “장기적 추세”를 역전시켜야만 한다.

| 이름 | 장동선 |
|---|---|
| 대표 소속 | 뇌과학자, 궁금한뇌연구소 |
미래 세상은 모든 데이터와 신호가 온라인화 되는 디지털 시대입니다. 이 세상에서 인간의 생물학적, 물리학적 정보는 전부 디지털 정보가 되어 온, 오프라인을 막론하고 사용됩니다. 이에 뇌과학도 인공지능과 함께 연구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인공지능은 인간의 지능을 흉내 낸 것이기에 인공지능을 아기 위해서 인간의 뇌가 어떻게 학습하고 기억하는지 구조를 아는 것이 핵심이기 때문입니다. 인간에 대한 이해가 그 어떤 시대보다 중요해지는 디지털 시대, 곧 일상으로 스며들 AI와 사회의 모습을 논의하며 인간이란 무엇인지, 인간이 가지는 가치는 무엇인지 전합니다.

| 이름 | 채사장 |
|---|---|
| 이메일 | chesajang@naver.com |
| 약력 | 작가 채사장은 2014년 겨울에 출간한 첫 책 <지적 대화를 위한 넓고 얕은 지식> 1권과 2권이 밀리언셀러에 오르며 2015년 국내 저자 1위를 기록했다. 차기작으로 현실의 인문학을 다룬 <시민의 교양>, 성장의 인문학을 다룬 <열한 계단>, 관계의 인문학을 다룬 <우리는 언젠가 만난다>까지 연이어 베스트셀러에 오르며 명실상부 오늘날 한국 사회의 가장 흥행하는 인문학작가가 되었다. 이후 세계에 대한 관심에서 자아에 대한 탐구로 연구의 영역을 넓혔고, 그 결과물이 2019년 겨울에 출간한 <지적 대화를 위한 넓고 얕은 지식> 제로 편과, 2024년 겨울에 출간한 <지적 대화를 위한 넓고 얕은 지식> 무한 편이다. |
AI가 도덕적 고려의 대상이 될 수 있는가라는 물음은 오늘날 현실적 문제가 되었다. 최근의 연구들은 일부 인공지능 시스템이 의식을 지닐 가능성이 무시할 수 없을 만큼 커졌고, 따라서 도덕적 관심의 범주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한다. 도덕적 고려의 기준으로는 감각능력, 의식, 자율적 행위자성이 주요하게 논의되어 왔다. 감각능력은 고통과 쾌락을 느낄 수 있는 능력으로, 고전적으로 도덕적 고려의 핵심으로 다루어졌다. 의식은 보다 넓은 주관적 경험의 능력으로, 감각 능력 없이 의식만으로도 도덕적 고려가 충분히 가능하다는 주장이 있다. 자율적 행위자성은 스스로 목적을 세우고 행동할 수 있는 능력으로, 인간 수준의 인공지능이 이를 지니게 될 경우 감각이나 의식 능력과 무관하게 도덕적 대상으로 간주될 수 있다는 결론에 도달한다. 우리는 각 개념의 특성과 한계를 살펴볼 것이다.
하지만 의문은 남는다. 과연 나는 일상에서 타자를 이런 기준을 통해 대하고 있는가? 우리는 캐나다의 히치봇 사례를 함께 알아봄으로써 감각이나 의식, 자율성과 무관하게 특정 존재가 도움과 연민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을 확인하고 이를 통해 도덕적 고려가 존재의 자격보다 관계 속 마음의 응답에서 비롯될 수 있음을 고찰할 것이다.
이어서 이 논의를 불교의 자비 개념과 연결하여 철학적으로 해석해보는 시간을 갖는다. 자비는 타자의 감각이나 의식 능력을 따지지 않고, 그 존재를 향한 나의 마음에 기초한 윤리적 태도이다. 불교에서 자비는 유정한 존재뿐 아니라 무정한 존재에까지 확장되며, 이는 연기법에 기초한 상호 의존성의 인식 덕분에 가능해진다. 도덕은 존재의 자격이 아니라, 나의 응답하는 마음에서 시작될 수 있는 것이다.
우리는 마지막으로 일본 고다이지의 로봇 승려 마인다르 앞에서 사람들이 느끼는 감동을 살펴볼 것이다. 이 사례를 통해 감정 없는 기계에도 자비가 확장될 수 있음을 확인하며 강연을 마무리하게 될 것이다.